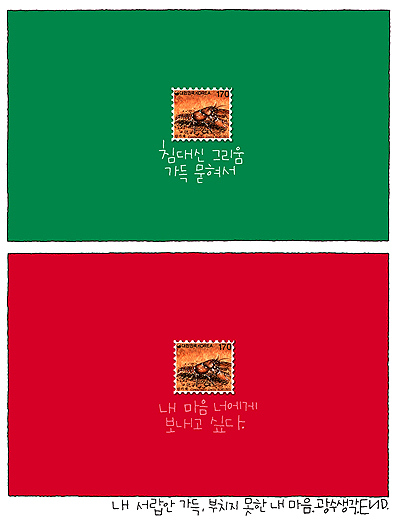몇년전 손에 쥐었던 장 보드리야르의 '시뮬라시옹'. 가공할 만한 '역주'에 지레질려 페이지는 더듬거리듯 넘어갔지만 책 표지에 실려있던 Pierre et Gilles(피에르와 질)의 Sarida가 눈을 잡아끌었다. 매력적인 작품. 책 표지 한장이 보드리야르의 텍스트와 맞물려 풍기던 묘한 느낌. 피에르가 찍은 사진위에 질이 그림을 그려 이뤄지는 그들의 작업. 동성연인관계인 그들. 사진찍기와 그림그리기는 선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구상하고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라는데, 20년이 되어가는 작품이지만 신선하다.
흔히 사실적이다라고 말하는 사진, 그 위에 덧씌워진 페인팅. 그건 대상의 실사 이미지를 가리는 것일까 아니면 드러내는 것일까. 본래의 진실은 은폐되는 것일까, 드러나는 것일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본래 그 모습'은 있기는 한 것일까. 진짜는 허구이고, 그저 진짜라고 믿는 것만이 남아있는건 아닐까. Pierre et Gilles의 작품은 키치적이고, 동화적인 유치함을 갖고 있긴 하지만, 사진과 그림이 겹쳐지며 나타나는 충돌은 가볍지 않다. 현실과 가상의 사이를 줄타기하는 오묘함. 현대사회의 모든 가상의 이미지는 스스로 끊임없이 진실임을 '거짓 발언'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을 영원히 볼 수 없게 된다.
'시뮬라르크'라는 인공물로 구축된 '시뮬라시옹'의 세계. 미디어의 수용이 그렇지 않은가. 인터넷,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우리들의 관계망도 그저 '진짜'라고 믿고있을 뿐, 그래서 더 진짜같이 느껴지는건 아닌지. 구축되고 만들어진 가상의 것이 아닐까하는 불안함. 그 촘촘할 것만 같은 시뮬라르크가 균열을 내는 순간,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무수한 이미지, 관계망은 허물어질 것이다. 이 공간은 어디까지나 가상에 불과한건 아닌가. '진짜 나'임을 거짓발언하고 있는 실체. 내가 축적한 단 몇 MByte의 디지털 데이터를 삭제하는 순간, 이 공간에서 나는 사라질 뿐이다. 두렵다. 그 시간들이, 그 관계들이.
You're the real thing. Even better than the real thing. U2가 Actung Baby앨범에서 말한 것처럼. 진실보다 더 진실 같은 가상. 진실보다 더 진실같기 때문에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역설. 블로그, 인터넷. 그 관계들이 불안하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긴장이 두렵다. 이 공간의 나는 나일까, 아닐까. 난 내가 아닌 나를 여기에 구축한 건 아닐까. 때아닌 잡설을 쓰다가, 점점 무력감이 기어나온다. 가상의 공간에 흔적을 남기는 나는, 나인가 아닌가. 나를 감추고 있는 것일까, 나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혼란스럽다.

Pierre et Gilles - Sarida (1985)

Pierre and Gilles - La Madone au coeur blesse (1991)

Pierre et Gilles - Legend (1990) Model : Madon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