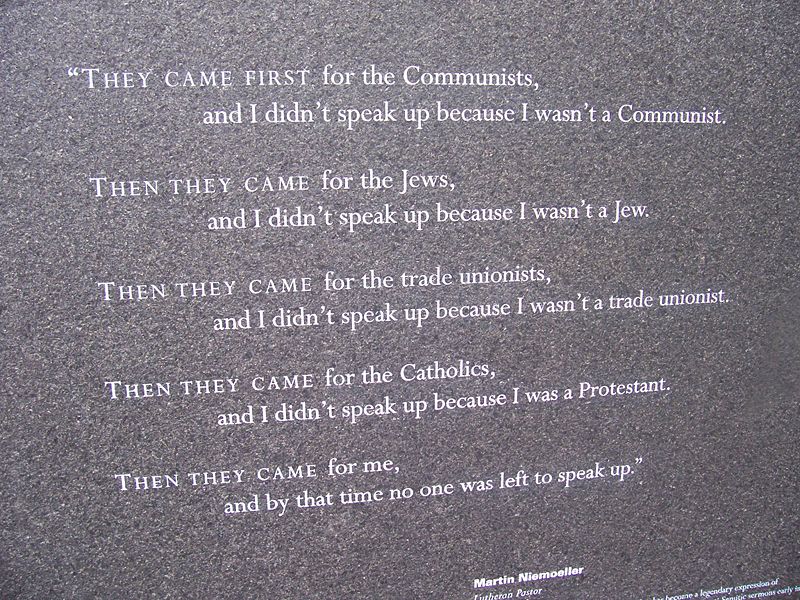토요일 오전에(왜 휴일엔 눈이 일찍 떠지는건지...)
오바마의 민주당 대선후보 수락 동영상을 봤다. 화려하고, 열정적이고, 한편의 잘짜여진 쇼처럼 진행되더라. 연설문 잘쓰고, 연설 잘하기로 소문난 오바마이다 보니 더 쇼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라 대선관련한 시시콜콜한 이슈를 외면하기 어렵지만, 솔직히 큰 관심은 없다.
우리나라 언론은 미국대선을 중요한 이슈로 취급하고 있지만, 오바마가 되느냐, 메케인이 되느냐는 사실 우리에게 근본적인 차이는 없을거다. 왜냐하면 그들 둘다 미국의 정치인이고, 철저하게 미국의 국익을 위해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도 당연한데
이 땅의 정치인들은 정반대로 움직이니 참으로 기이한 족속들이다) 미국내 이슈에 대한 정책적 차이는 극명할지 몰라도 외교문제에 있어서는 차별성이 그다지 느껴지지 않는게 사실이다.
뭐, 파병이 걸려있는 이라크, 아프칸 문제나 우리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법의 차이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온도차이는 존재할 것이다. 또 희대의 악동 부시가 저질러 놓은대로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뻘짓을 한다면야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한번 호되게 악몽을 경험한 미국인들이 또 그같은 뻘짓을 눈뜨고 봐줄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기대하고 싶은 간절한 심정이다)
오바마의 연설을 보면서 부러웠던건 앞에서 얘기했듯이 오바마의 당선이 '한국에 어떤 콩고물이 떨어질까?'라는 기대 때문이 아니라 (그런건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 그가 미국인들에게 심어주고 싶어하는 가치, 꿈 때문이었다. 모름지기 국가를 이끌 정치인이라면 국민에게 자신의 비전을 펼치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과연 어떻게 해나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져줘야 하지 않을까.
어느 나라에 사시는 누구처럼
'747', 국민소득 몇만불, 경제를 살립시다'라는 허울만 그득한 레토릭으로 국민을 호도할 문제가 아니란 말씀이다. 적어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라면 말이다. 아무런 실천이 담보되지 않은 레토릭이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하고 있는지, 두말하면 잔소리다.
오바마는 수락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자신이 이루려하는 국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말이다.
What is that promise?
It’s a promise that says each of us has the freedom to make of our own lives what we will, but that we also have the obligation to treat each other with dignity and respect.
Ours is a promise that says government cannot solve all our problems, but what it should do is that which we cannot do for ourselves? protect us from harm and provide every child a decent education; keep our water clean and our toys safe; invest in new schools and new roads and new science and technology.
Our government should work for us, not against us. It should help us, not hurt us. It should ensure opportunity not just for those with the most money and influence, but for every American who’s willing to work.
That’s the promise we need to keep. That’s the change we need right now. So let me spell out exactly what that change would mean if I am President.
오바마는 얘기한다. 정부는 우리와 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해야 하고, 우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기위해서 일해야 한다. "Our government should work for us, not against us. It should help us, not hurt us." 이 말을 듣고서 무척이나 씁씁해졌다. 과연 지금 우리의 정부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우리가 아니라
그들 일부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는 않은가. 뜨거웠던 6,7월의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정부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자문하지 않았었나 '그들은 과연 누굴 위해 일하고 있는가'라고
오바마는 포장된 언어가 아니라 나름 진실한 언어로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려하는 느낌을 받았다. 왜 그렇게 느끼냐고 묻는다면 딱히 할말은 없다. 감동, 진실, 상식, 약속. 그것이 실천의 형태로 실현될 것인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겠지만, 적어도 그런 오바마의 연설에서 미국인들은 어떤 희망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해볼 뿐이다.
오바마가 말하는 약속은 가령 이런 것이다. 정부가 모든것을 해결해주지는 못하지만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건 시민을 보호하고, 모든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물을 깨끗이 하고, 장난감을 안전하게 하고, 새로운 학교, 새로운 도로, 새로운 과학과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위에 굵은 글씨) 깨끗한 물, 안전한 장난감. 그냥 그런게 정치이고, 비전이고, 우리가 정치인에게 바라는 것일게다.
Tonight, more Americans are out of work and more are working harder for less. More of you have lost your homes and even more are watching your home values plummet. More of you have cars you can’t afford to drive, credit card bills you can’t afford to pay, and tuition that’s beyond your reach.
These challenges are not all of government’s making. But the failure to respond is a direct result of a broken politics in Washington and the failed policies of George W. Bush.
끝으로 쓴소리 한마디. 부시정부를 비판하면서 얘기한 오마바의 말을 청와대의 그분과 그 일당들에게 해주고 싶다. 한국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이 모든 경제위기가 정부가 만들어낸 것은 아님에 분명하다. 하지만 연일 삽질을 계속하고 있는 현 정부의 대응 실패는 여의도 정치와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정책 탓이다. 당연한 말이 아닐 수 없다. (백번 더 잘하겠다고 조아려도 부족한 이 판국에 한 청와대 수석은
우리 경제가 지난 6개월간 선방했다는 따위의 혈압올라가는 망발이나 하고 있으신 중이다. 젠장.)
연설 전문 및 동영상
http://my.barackobama.com/page/community/post/samgrahamfelsen/gG5l5C